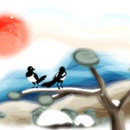 |  | | | ⓒ i김천신문 |
임진년 설을 맞는다. 신묘년도 물 흐르듯 보내고 신년 새해를 맞았다. 송구영신, 한해를 반성하고 이제 새해는 한 해를 설계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안아본다. 한 해의 빠르기는 세대마다 다르다고 한다. 세월의 빠르기는 나이에 정비례하고 가속도가 붙는다는 나이 든 이들의 한스런 푸념이다. 그러나 삶은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이다. 삶에 가치가 부여될 때 나이와는 상관없다. 어느 서양 철학자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네 가지의 곤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개미처럼 사는 사람’, ‘매미처럼 사는 사람’, ‘꿀벌처럼 사는 사람’, ‘거미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이 세상을 구성하고 살아간다고 한다. 개미 같은 사람은 일평생 앞뒤 돌아보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이다. 자기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성취감 속에 만족하는 사람이겠다. 매미 같은 사람은 남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일은 하지 않고 노래하고 쉬면서 유유자적하는 사람이다. 남이야 어쨌든 자기 쾌락만이 전부인 스스로 자족하면서 놀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반면 꿀벌은 열심히 일한다는 점은 개미와 같지만 유용한 꿀을 인간에게 제공함으로 남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 희생봉사 헌신하는 사람에 비길 만하다. 일종의 박애주의자다. 그러나 거미는 열심히 거미줄을 치면서 일하지만 다른 곤충이 걸려들기만 기다리면서 음흉한 마음으로 일을 도모하는, 말하자면 일하는 목적이 다르다. 사람으로 비기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기회주의자요 사회를 멍들게 하는 범죄자요 악한이다. 설날을 맞으며 우리 모두가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나 남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꿀벌 같은 존재이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은 복지를 지향하는 세태라서 저소득층이 살기에 많이 수월해 졌다고 하지만 자꾸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이라 나라가 잘 살수록 더 많은 상대적 가난뱅이가 양산되고 있다. 이런 때에 꿀벌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고 살만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서양속담에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표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의미다. 19세기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얼굴에서 표정을 지우면 감정도 침묵한다’는 이론은 1980년대부터 재평가를 받아 미국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각기 다른 감정표현을 흉내 내면 우리 몸도 그에 따라 독특한 생리적 유형을 띠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일부러라도 미소를 지으면 더 마음이 즐거워지고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슬픈 표정을 지으면 더욱 마음이 슬퍼지고 화나는 표정을 지으면 더 현실이 화가 나고 역겨운 표정을 지으면 역겨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올 한 해는 꿀벌 같은 사람이 많아서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한 해 되기를 기대해 보자. 거기다 금상첨화로 오가는 시민의 미소가 세상까지 바꾸는 한 해로 되었으면 한다. 시민 개개인이 모두가 자기의 소망 하나씩을 이루는 새해, 그리고 임진년 연말에는 소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해가 되기를 열망해 본다.
|
 회원가입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