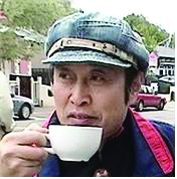 |
 |
|
| ↑↑ 정영화 (시인) |
| ⓒ 김천신문 |
518년을 이어온 조선왕조에 대한 대체적 평가는 어떠한가. 유교이념에 경도된 소모적 당쟁으로, 명분에 치우친 문약(文弱)한 사회기반 조성으로 실사구시를 외면한 채 철저한 계급주의 사상이 인권을 외면한 암울한 시대였다는 평가가 있다. 조선 통치이념이 충효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률이었으며, 철저한 가부장적 권위가 시대의 덕목으로 인정받았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을 통해 국민적 결속을 도모하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통치철학이었을 것이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들라하면 세종대왕을 꼽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세종은 개국 초기의 처절한 정변을 마무리하면서 내부 결속을 위한 국민교화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 과정에 탄생한 것이 1443년의 한글이었고, 그보다 앞선 1432(세종 16)년에 국민윤리교과서인 『삼강행실도』를 직제학(直提學) 설순( 循) 등에게 명하여 책으로 편찬케 한 것이다.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엄선하여,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알기 쉽게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이다. 성종 때인 1481년에는 한글로 뜻을 풀어 쓴 언해본도 발간하였다. 국어학 연구와 당시의 생활, 환경, 복식사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문헌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은 『천자문』이고 바로 다음이 『삼강행실도』이다. 국민윤리교육의 교과서였다. 삼강이란 중국 한나라의 유학자 동중서와 반고가 말한 세 가지 덕목이다. 잘 알다시피 세 가지 덕목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이다. 임금은 신하에게, 어버이는 자식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근본이라는 뜻이다.
조선은 명분과 이념에 치우친 나머지 합리적 문화발전을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나라이다. ‘삼강’을 매우 중요시할 수밖엔 없었고 그래서 양반은 물론이고 평민들에게도 충과 효, 열을 강조했던 것이다.
『삼강행실도』에는 113명의 충신과 110명의 효자, 95명의 열녀가 소개되어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부분 중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충신 6명, 효자 4명, 열녀 6명뿐이다. 효자 4명 가운데 부모 아닌 스승을 모신 효자가 바로 김천 지례 출신 윤은보(尹殷保)와 서즐(徐 )이다.
당시의 열악한 출판 상황과 국민교육시스템을 감안해 볼 때, 나라에서 펴낸 교과서에 우리 고장의 두 인물이 실렸다는 것은, 그것도 극히 소수의 인선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고장 사람들에겐 대단한 자긍심이고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윤은보와 서즐은 고려 공민왕 때의 학자 반곡(盤谷) 장지도(張志道)가 조선의 개국 초기 정치적 혼란에 환멸을 느끼고 고향인 지례현으로 낙향하자 그의 문하에서 공부하며스승을 군사부일체의 도리로써 모셨다. 장지도가 후사를 두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두 제자는 스승을 친부처럼 모셨고, 그가 죽자 3년간이나 스승의 묘에서 시묘살이를 하며 극진한 효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은보와 서즐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지만, 사람답게 길러주신 분은 스승님이시다.”라고 하였다. 사도(師道)와 효의 관념이 갈수록 쇠락해 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재평가 받아야할 위대한 김천인이 아닐 수 없다.
『삼강행실도』가 발간되면서 작은 촌락 지례현은 일약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으뜸 고을로 부상했다. 지례(知禮)라는 지명 자체가 예를 안다는 뜻. 이후 조선사에 영남이 충효의 본향으로 불리어지는데 큰 몫으로 기여했음은 당연하다. 지례현은 충·효·열이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스승을 효로서 극진히 모신 두 사람에 의해 전국적으로 예의 고장으로 떠올랐다. 이때 김천 지역민의 자부심 또한 최고조에 달했다.
지례면 교리에는 『삼강행실도』에 실린 반곡 장지도와 윤은보, 서즐을 기리는 삼 선생 유허비와 정려각이 서 있다. 이는 600년 세월을 건너와 김천이 정신적으로 조선의 최고로 부상했던 한 시대를 상기시켜주는 문화유산이다.
 회원가입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