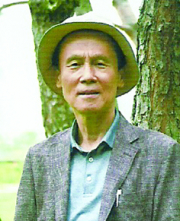 |
 |
|
| ⓒ 김천신문 |
또한 적암의 칠언율시에 「표 교리와 태 개령 현감을 모시고 거듭 직지사에 노닐며 감회가 있었다陪表校理 太開寧 重遊直指寺 有感」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적암의 「직지사시直指寺詩」로 일컬어지는 작품이다. 이를 전하는 지역 향토사 문헌들 간에는 전재와 번역상의 오기와 차이가 있는데 『적암유고』의 것을 원전 삼아 소개해 본다.
直指耽耽一道場 직지는 무성한 숲속의 한 도량인데
坐看興替事堪傷 성쇠를 바라보니 일마다 감상이 이네
祖公在日緇徒盛 조사(祖師) 계실 땐 승려가 흥성하더니
恩老辭歸寶殿荒 은로, 하직하고 돌아가니 보배로운 전각 황량해라
松竹斬斷空兀兀 소나무 대나무는 베어 끊은 듯 공중에 찔러 섰고
雲山矗立但蒼蒼 구름 속에 산은 우뚝 서서 다만 푸르고 푸르네
置此且陪香案吏 이런 자리에 또 배로 현감을 모시어
細傾彭澤菊花觴 도연명의 국화주 술잔 자세히 기울이네
- 『금릉군지』(금릉문화원, 1994), 『국역 교남지』(김천문화원, 2002, 『국역 김천군지』(김천문화원, 2008),
『국역 적암유고』(김천문화원, 2018).
‘향안리香案吏’는 현감을 뜻한다. 어느 가을날에 적암이 직지사에서 현감을 모셔 잔 기울여 노니는 정경을 그렸다.
적암은, 무오사화가 일어나 매계가 전라도 순천으로 이배 가자 자신도 관직을 버리고 김산으로 낙향했다. 봉계에 금시헌이라는 당을 짓고 풍류와 시문에 열정을 쏟으며 세월을 보낸다. 이때 적암이 쓴 「김산제영金山題詠」 칠언율시 두 수가 있는데 그중에 돋보이는 한 수가 있다.
靑春白日挽難回 청춘의 밝은 날은 만회하기 어렵고
七十衰翁歸去來 일흔 쇠옹이 귀거래를 읊조리네
種竹澆花幽事足 대를 심고 꽃 물주기 그윽이 족한데
獨無人間好懷開 좋은 회포를 열 사람 없이 홀로 지내네
- 『금릉군지』(금릉문화원, 1994), 『국역 김천군지』(김천문화원, 2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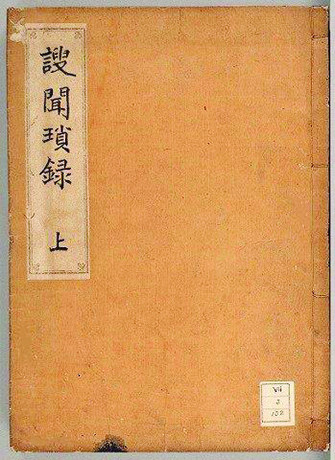 |
|
자잘한 이야기나 사건을 듣고 기록하였다는 뜻의 책 “소문쇄록” 상권(조신 씀).
|
|
정계를 떠나 향리에 은거하는 자를 찾아주는 이 누가 있는가, 하는 고적한 심정을 담아냈다.
적암은 서자로 태어난 신분 한계에 대한 울분을 종종 토로했는데, 이를 친교하는 이행(李荇 호 容齋 1478 성종 9~1534 중종 29)이 대신 아파해 주고 쓰다듬어 주었다.
매계가 의주로 유배를 간 해 가을에 적암이 고향에 남아 쓴 시 한 편을 더 소개한다. 사화라는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장래를 한 치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처지에서 처참함과 굶주림에 젖은 모습을 나타낸 「대풍가大風歌」다.
大風歌
大風吹兮山水折 큰 바람 불어옴이여! 산 속 나무 부러지네
猛獸吼兮山石裂 맹수 부르짖음이여! 산 속 돌 찢어지네
男兒天出扶明堂 남아 태어나 명당을 부축하여 바로 세워야 하건만
成敗紛紛安足說 성패 어지러움 어찌 족히 말하리오
我臥空山秋己深 내, 빈 산 속에 누우니 가을 이미 깊은데
霜露欲落歲將駸 서리 이슬 떨어지려 하니 세월은 빨리 흐르려 하네
形軀豈是異等輩 이 몸 어찌 같이 어울리는 무리와 다르리오만
天獨忍予老山林 하늘은 홀로 나에게만 산림에서 늙게 하는가
從人粒食慰飢渴 따르는 사람 날곡식 먹으며 굶주림 위로하는데
卽興狂歌聊散髮 흥에 겨워 미친 듯 노래하며 오로지 산발하고 있네
淸夜且狙奈爾何 맑은 밤 장차 가려 하니 너를 어찌하리
獨與啼鵑怨殘月 홀로 우는 두견새와 더불어 쇠잔한 달 원망하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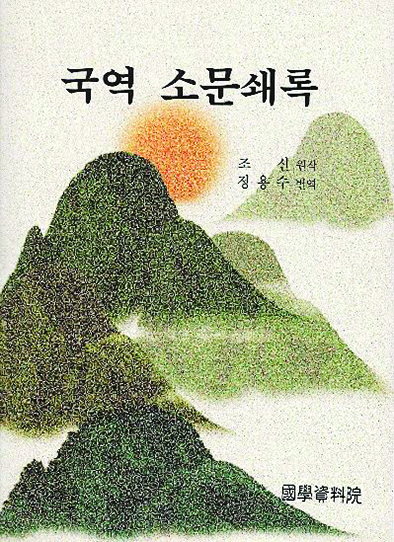 |
|
국학자료원에서 1997년에 정용수 번역으로 발간한 『국역 소문쇄록』.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활동한 지식인층의 동향과 시화를 중심으로 저술한 잡록임.
|
|
성종이 승하하고(1494년 12월), 점필재가 세상을 떠나고(1497년 7월), 무오년 사화가 일어남(1498년 8월)은 적암 집안에 불어닥친 큰 회오리바람이었다. 이런 사정을 ‘큰 바람’ ‘맹수’ ‘서리와 이슬’ ‘쇠잔한 달’의 이미지를 빌어 표현했다. 형 매계를 유배지에 보내고 관직도 내려 놓고 고향에 내려와 은거하고 있는 적암의 신세를 알려 준다.
눈여겨 봐야 할 적암의 시 한 편이 더 있다. 1506년 9월 2일 중종반정을 맞아 적암이 사면령을 기다린 내용을 담은 시다. 연산군이 물러가고 중종이 등극한 얼마 후(적암 52세)에 쓴 칠언율시 「매계 숙형 운에 차운하다次梅溪叔兄韻」다.
鷄竿雨露佇何時 사면령 은혜 언제 입을까? 우두커니 생각하고
獨對靑山蹙兩眉 홀로 청산 마주하며 두 눈썹 찡그리네
濯足江于賖濁酒 강가에서 발 씻고 탁주 외상으로 사고
岸巾林下探淸詩 숲 아래서 두건 비스듬히 쓰고 맑은 시 찾네
滴殘苦淚緣明主 뚝뚝 떨어지다 남은 눈물은 밝은 임금 때문이나
烹盡新茶爲病脾 새 찻잎 모두 삶은 건 비장 병 고치기 위함일세
誰料金鑾舊學士 누가 헤아려 주리오, 예문관 옛 학사가
屋穿籬缺被人欺 집 뚫리고 울타리 무너져 사람들 업신여김 당하는 줄을
예문관 학사 조위의 집과 담장이 무너져 내려도 손을 못 쓰는 상황, 적암 자신도 병이 들어 있던 모양이다. 당시의 아주 암담하고 처참한 생활상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집안에 닥친 고난과 불행에도 죄인의 집이라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못하는 애달프고도 참담한 마음을 드러냈다.
<계속>
 회원가입
회원가입